화려한 배우만큼이나 화려한 드라마 작가의 세계, 특히 스타작가들은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엄청난데요.
오늘은 현실판 길라임이라고 불리는, 단칸방에서 새우깡으로 삼일을 버티던 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책 한권조차 없던 가난한 소녀

2003년 대학 동기 강은정 작가와 공동 집필한 드라마<태양의 남쪽>으로 데뷔한 김은숙 작가. 그녀는 2004년<파리의 연인>을 시작으로 단 한 번도 흥행에 실패한 적 없는 로맨스 드라마의 대가입니다.
또 아시아 전역에 부는 한류열풍에 중심에 서있는 작가이기도 하죠.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김은숙 작가.
그녀는 과거 한 인터뷰를 통해 드라마 작가로 데뷔하기 전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고백했는데요.
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 홀어머니 밑에서 남동생 두 명과 함께 자란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‘현실은 별로인데 이상이 높아 불쌍한 아이’라고 표현했습니다. 아버지의 죽음 뒤 어머니와 삼 형제는 줄곧 가난하게 살았고, 너무 가난해서 변변한 책 한 권 사 읽지 못했다고 하는데요.
고등학교 졸업 후

어린 시절 가난한 일상이 싫어 일기를 쓰는 대신 동시로 일기를 대신했던 김은숙 작가. 당시 그녀의 선생님은 어린 그녀가 쓴 동시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, 그 칭찬 덕에 그녀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죠. 하지만 현실의 벽은 그녀에게 너무 높았습니다.
김은숙 작가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는데요.
그렇게 평범하게 고졸 출신 일반 사무원으로 보낸 세월이 무려 7년. 그녀는 일을 하면서도 시간을 아껴 <토지><태백산맥> 등을 비롯한 오정희와 신경숙 작가의 책을 모두 섭렵할 정도로 소설을 좋아했다고 하죠.
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서울예대 입학 광고는 잠시 잊었던 꿈을 상기시키는데요.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“서울예대 입학 광고를 봤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. 갑자기 잊었던 꿈이 억울했어요.”라며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죠.
뒤늦은 꿈 찾기

그렇게 그녀는 7년간 경리를 하면서 모은 2천만 원을 가지고 부모님 몰래 상경해 대학 입학시험을 보게 되는데요.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합격 소식에 “너 할 만큼 했다. 네 갈 길 가라. 입학금밖에 못해주니 생활은 알아서 해라”라고 하면서도 “하나 약속한 건 그녀에게 앞으로 손은 안 내밀게”라며 꿈을 찾아 떠나는 딸을 격려해주셨다고 하죠.
동경하던 신경숙 작가 같은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서울예대 문예 창작과 늦깎이 신입생이 된 김은숙 작가.
인생 처음 자신의 꿈을 쫒게 된 그녀에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지만, 그만큼 어려움도 적지 않았는데요. 바쁜 학부 생활을 하며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모두 마련하는 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.
잘될줄 알았는데..

대학 졸업 후 신춘문예에 도전, 하지만 2년 동안 낙방하고, 대학로에서 희곡을 쓰며 작가 생활을 시작한 김은숙 작가. 하지만 변변치 않은 수입 때문에 대학시절 서울로 올라와 줄곧 살았던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.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녀는 이대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 새우깡 한 봉지를 먹고 3일을 버틴 적도 있다고 하죠.
꿈을 찾아 상경했지만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은숙 작가. 그러던 중 드라마 제작피디를 하던 지인이 “언니 드라마를 한번 써보는 게 어때”라며 드라마 집필을 권했는데요.
지인의 제의에 그녀가 물은 첫 마디는 바로 “돈 많이 줘?”였다고 하죠. 신춘문예도 수차례 낙방 한 그녀가 얼마나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. 그렇게 월급 70만 원을 받고 드라마를 쓰기 시작한 김은숙 작가.
끝없는 도전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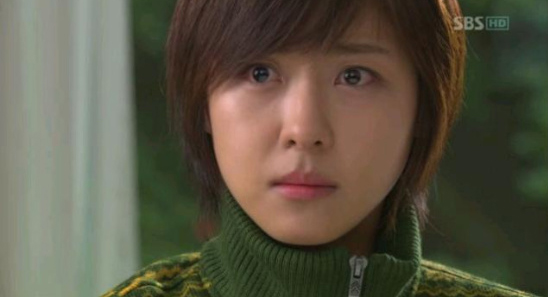

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 강은정 작가와 함께 최민수, 최명길 주연의 드라마<태양의 남쪽>을 쓰게 되고, 신인작가로서 꽤 괜찮은 성적표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데뷔하게 되는데요.
그 후 2004년 지금의 김은숙 작가를 만든 그 작품 <파리의 연인>으로 초대박을 터트리며 본격적으로 스타작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.
가난했던 어린 시절, 꿈을 쫒아 배고팠던 젊은 날을 뒤로하고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흥행작가로 거듭난 김은숙 작가. 인생역전 성공신화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요?










